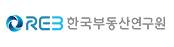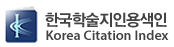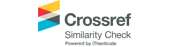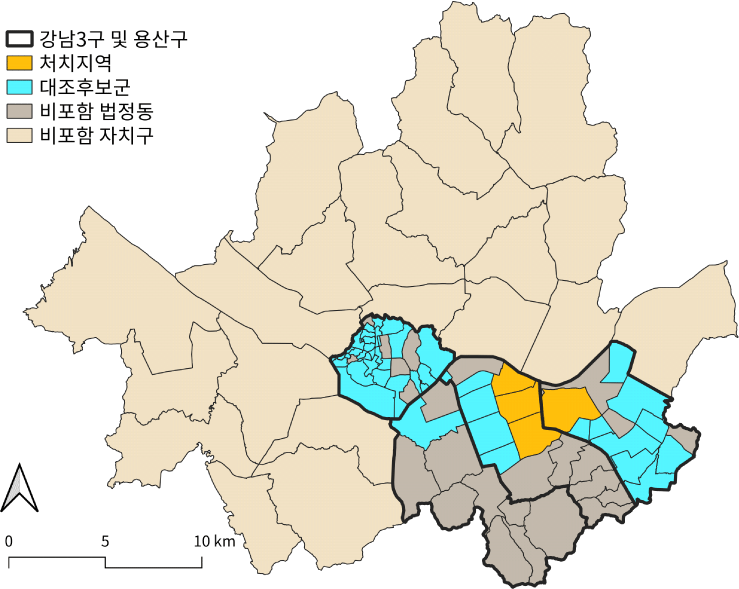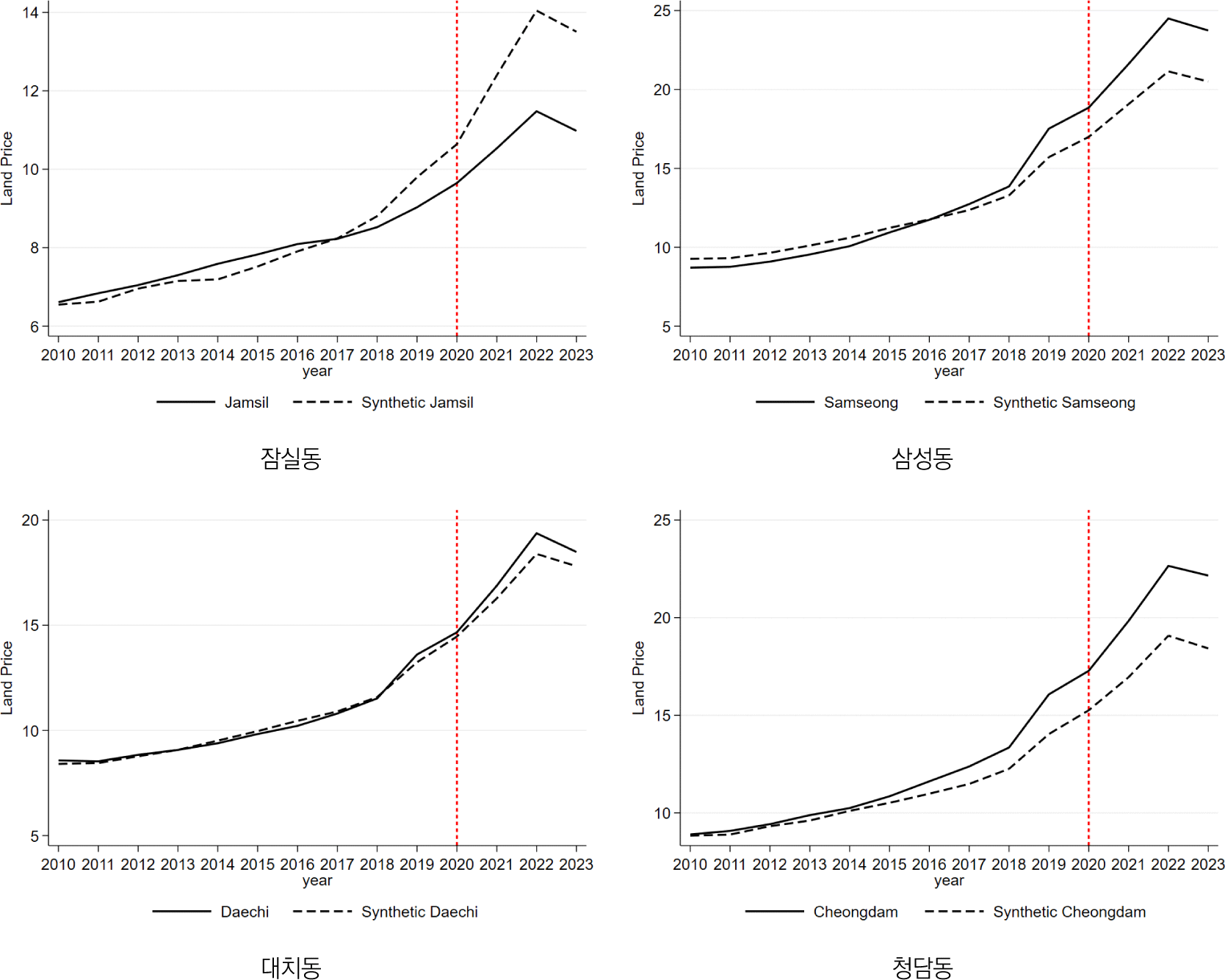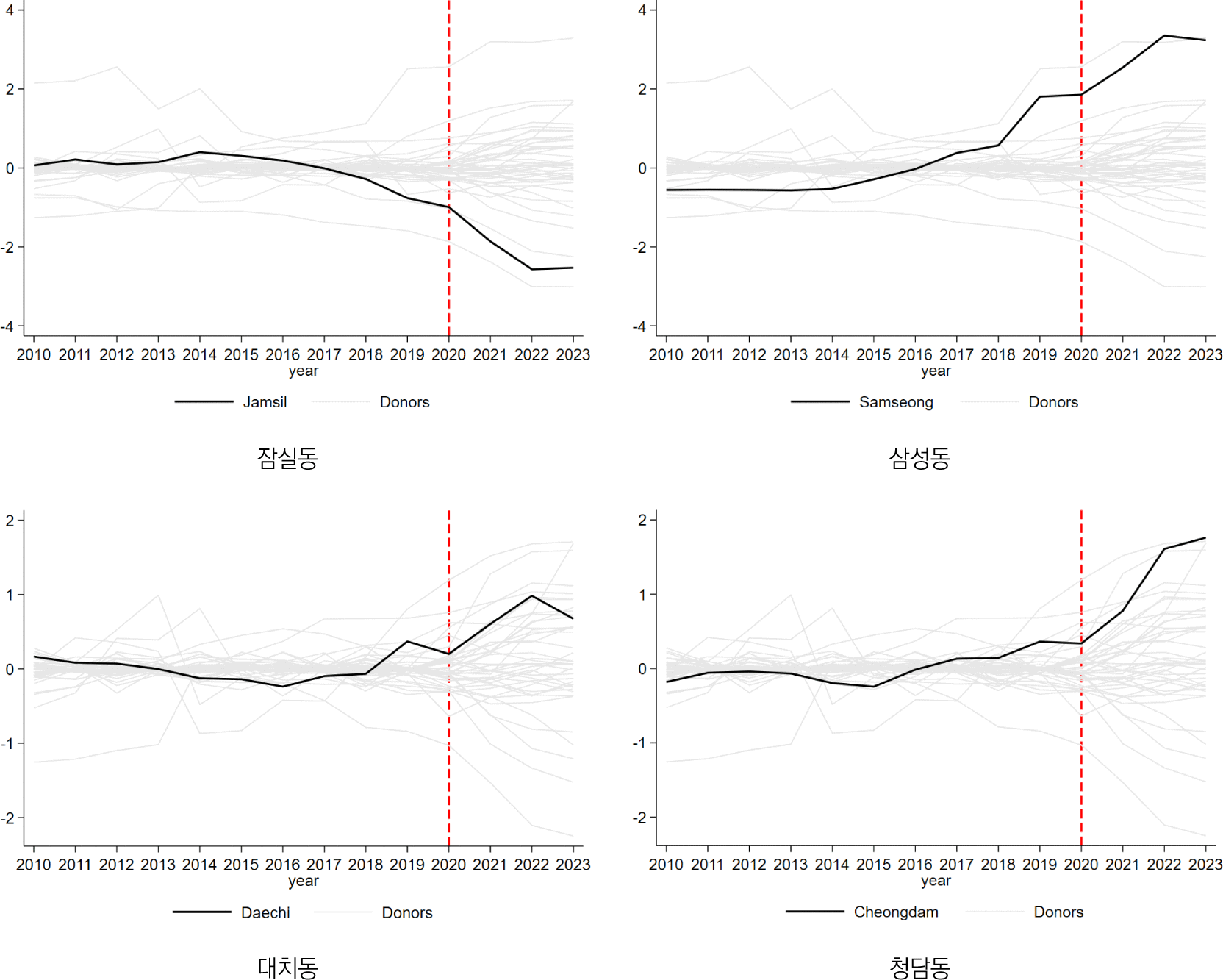Ⅰ. 서론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투기 수요에 의한 시장 왜곡과 외부효과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대표적인 장소기반 정책(placed-based policy)에 해당한다. 도시 및 지역 정책에서 사람기반 정책(people-based policy)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나 고소득층 대상 보유세 강화처럼 특정 개인이나 계층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반면, 장소기반 정책은 특정 지역이나 자산에 대한 규제를 통해 풍선효과나 전이효과 등 공간적 파급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특징이다(김하영, 2022). 이러한 특성은 장소기반 정책이 지역의 공간 구조와 시장 여건에 따라 국지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적용에 있어 공간적 세분화와 지역 맞춤형 접근이 요구되는 제도임을 보여준다.
정부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제와 유사한 수단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해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해왔다. 해당 지역에는 대출 규제, 세제 강화, 전매 제한, 청약 및 정비사업 규제 등 복합적인 수요 억제 조치가 적용되었다(양완진·김현정, 2020). 그러나 2017년 8·2대책과 2020년 6·17대책을 통해 규제 지역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불안정성과 가격 상승 압력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지역에 적용된 간접적인 수요 억제 조치만으로는 투기 수요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거나 시장 과열 양상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1). 이에 따라 정부는 간접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위해 2020년부터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하였다. 해당 제도는 단순히 금융·세제 조건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사전 허가를 요구함으로써 거래 성사 자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점에서 토지거래허가제는 기존의 간접 규제보다 더욱 강력하고 정밀한 시장 개입 수단으로 평가된다 (정광호·김원수, 2005; 정종훈, 2021).
토지거래허가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선택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되어 온 지역 맞춤형 규제 수단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순환적 운영 방식이 서울의 주요 고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이전까지 일부 필지 중심의 지정 방식에서 벗어나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인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2017년 이후 부동산 시장 과열이 본격화된 가운데, 11년 만에 서울 도심지에서 특정 동(洞) 전역을 포괄적으로 지정한 사례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다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한국주택금융공사, 2020). 이들 4개 법정동은 약 4년 8개월간 연속 지정되며 제도가 지속되었으나, 2025년 2월 서울시는 시장 안정화 흐름에 따라 일부 구역에 대한 지정 해제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해제 직후 단기간 내 시장 과열 조짐이 재차 나타나면서, 서울시는 불과 34일만에 규제를 재도입하고 지정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시장 과열기에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핵심적인 직접 규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유도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한편, 자유로운 시장 기능을 제약하고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시장적 조치라는 비판도 공존한다(서울시, 2025). 특히 최근에는 허가구역의 지정과 해제가 단기간 내 반복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평가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제로 지가 상승을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인 수단인지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당 제도가 시·군·구보다 더욱 세분화된 동 단위에서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의 효과를 정확히 식별하기 위해서는 보다 미시적인 공간 단위에서의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가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의 지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6월 23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4개 법정동을 처치지역으로 설정하고, 지정 이력이 없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의 44개 법정동을 대조후보군(donor pool)으로 구성하여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 SCM)을 적용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시·군·구 단위로 공간을 집계하여 정책 효과를 분석해 온 반면, 본 연구는 동 단위 지역을 분석 단위로 설정함으로써 보다 미시적인 수준에서 정책 효과를 식별하고자 한다. 이는 하나의 자치구 내에서도 지역별 특성과 시장의 반응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 효과의 공간적 이질성과 국지적 반응의 차이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시점부터 최대 5년 동안 유지할 수 있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매매, 교환, 증여, 사용대차 등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실수요 목적 여부에 따라 허가 여부가 제한되며, 허가 목적 외로 사용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1978년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지가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1985년 충청남도 대덕연구단지 개발지역이 최초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1993년에는 금융실명제 시행과 함께 전국 토지의 93.8%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부동산시장 침체에 대응하여 전국 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되었다. 이후에도 수도권 내 개발 예정지나 재건축·재개발 지역 등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재지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표 1>은 강남3구 및 용산구를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을 보여준다. 2020년 이후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별 필지 수준이 아닌 법정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 지정 방식이 본격화되었으며, 규제의 범위와 강도 측면에서 제도의 운영 방식이 실질적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중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의 4개 동은 2020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4년 8개월간 연속 지정되며 지속적 규제가 이루어진 대표적 사례로, 제도의 안정적 운용 사례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25년 2월, 해당 동 내 아파트 305개 단지 중 291곳에 대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면서 국지적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해제 직후 시장은 빠르게 반응하였다. 한 달간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각각 0.72%, 0.69%, 0.62% 상승하며 약 7년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였다(한국부동산원, 2025). 평균적으로 약 3.75%의 가격 상승이 발생하였고, 같은 기간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도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 증가의 신호가 포착되었다(서울특별시, 2025). 이에 따라 서울시는 규제 해제 34일 만인 2025년 3월 24일, 해당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복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전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총 2,200개 단지, 약 40만 호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이후 특정 동이 아닌 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사례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 규제 완화가 예상보다 급속한 시장 과열로 이어졌다는 정책적 판단 아래, 정부가 강남권 및 도심권 핵심 지역의 투기적 거래를 보다 강도 높게 차단하고자 한 대응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토지의 가격, 즉 지가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지만, 토지는 다른 재화와 달리 물리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공급이 비탄력적이며, 단기적으로 공급량을 조절하기 어렵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도시 내 인구 증가, 주택 수요 확대, 산업활동의 활성화 등으로 수요가 증가할 경우, 공급이 이를 즉각적으로 따라가지 못해 지가는 급격한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또한 토지의 용도, 입지, 개발 가능성 등은 지가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며, 도시계획이나 기반시설 투자 등 정부의 정책적 개입 역시 지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주영, 2005). 이처럼 토지는 고정성과 입지 특수성을 지니는 자산으로서, 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되기 쉬운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은 토지가 다른 자산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시장 메커니즘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공급이 제한적인 토지 시장에서는 가격 급등에 따른 외부효과와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공적 개입이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제도적 대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이론적 기초는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가 19세기 말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에서 제시한 토지공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토지를 공공의 자산으로 보고 사적 소유에서 발생한 이익은 사회 전체가 환수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이후 그린벨트, 공공택지,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제도로 확산되었으며, 오늘날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이 흐름 위에서 부동산 시장의 투기 거래를 제한하고 합리적인 시장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직접 규제 수단으로 제도화되었다(한국주택금융공사, 2020).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대출 규제, 세제 강화, 전매 제한 등 간접적 수요 억제 조치의 영향(노동권 외, 2021; 박유현, 2018; 박진백, 2019; 이주희·유선종, 2021; 임현묵·이용만, 2024; 최문규·성현곤, 2022; 황관석·박철성, 2015)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같은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의 영향(김대원·유정석, 2014; 송경호·권성오, 2020; 송태호 외, 2018; 양완진·김현정, 2020)에 집중되어 왔다. 반면, 부동산 거래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 효과를 독립적으로 식별한 실증 연구는 극히 드물며, 최근 수행된 사례로는 김주영(2005), 김하영(2022), 정광호·김원수(2005)가 유일하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일부 고가 주거지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지정 범위가 협소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어 온 결과, 분석 가능한 사례가 제한적이고 시계열 자료의 축적도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김하영(2022)은 2020년 6월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사례로, 해당 규제가 아파트 매매가격과 거래량에 미친 영향을 공간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허가구역 내 아파트 가격은 규제 시행 이후 약 3.7% 하락하였고, 경계선 외부 500m 이내의 인접 지역에서도 약 4.2%의 가격 하락이 나타나 가격 전이효과가 확인되었다. 거래량은 허가구역 내에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인접 지역에서는 뚜렷한 증가세가 관찰되지 않았다. 해당 연구는 규제의 공간적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규제가 실제로 적용된 공간 내의 직접적인 처치효과를 식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김주영(2005)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투기지역 지정, 10·29 대책 등 부동산 규제정책이 지가 변화에 미친 영향을 자기회귀오차모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0·29 대책은 지가 상승을 유의하게 억제한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지역 지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는 규제비용에 비해 기대수익이 크다는 점에서, 투기 수요 억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정광호·김원수(2005)는 천안시와 아산시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토지거래량에 미친 영향을 시계열 차단설계 기반의 준실험적 접근으로 분석하였다. 자기회귀모형에 통제변수를 포함한 분석 결과, 규제는 기대와 달리 거래량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투기 수요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다만 해당 연구는 대조군 없이 단일 집단의 시계열 변화를 기준으로 정책 효과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동시기 외생적 요인이나 시장 전반의 추세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에 규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이중차분법을 활용해 왔다. 이중차분법은 정책 시행 전후의 평균 변화를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비교함으로써, 정책의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중차분법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정책 시행 이전 시점에서 유사한 추세를 보여야 한다는 평행추세 가정(parallel trends assumption)을 전제로 하며,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분석의 신뢰도에 제약이 따른다. 이에 본 연구는 규제의 실제 적용 단위인 법정동 수준에서 처치집단을 설정하고, 통제집단합성법을 적용하여, 토지거래허가제가 지정 지역의 지가 안정에 미친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통제집단합성법은 정책 시행 이전 시점의 지가 추세와 예측변수를 기준으로 반사실적 경로를 구성하며, 특히 사전 추세가 유사한 통제집단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중차분법보다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다 (김혜림·문태헌, 2023; Kreif et al., 2016). 다음 절에서 분석모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Ⅲ. 분석방법 및 자료
통제집단합성법은 정책이 시행된 단일 지역 또는 국가와 같은 집계 단위를 처치집단(treatment unit)으로 설정하고, 이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복수의 통제집단(control units)을 가중 결합함으로써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나타났을 반사실적(counterfactual) 경로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적절한 비교집단을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책의 인과적 효과를 신뢰성 있게 식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경제학 및 지역 정책 분석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김경훈, 2022; 김우영·김만규, 2021; 이정기·문정빈, 2020; 이희선 외, 2020; 하정원 외, 2022; Abadie, 2021; Athey and Imbens, 2017; Kim and Lee, 2019; Lee, 2024; McGraw, 2020).
Abadie(2021)이 제시한 모형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J+1개의 지역이 있다고 할 때, 첫 번째 집단(j=1)을 처치집단, 즉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역으로 설정한다. 통제집단합성을 위한 대조후보군은 J개로(j=2, …, J+1)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지 않은 지역에 해당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T 기간으로 1~T0 기간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기 이전(pre-treatment)의 기간을 나타내며 T0+1~T 시기는 정책 시행 이후(post-treatment)의 기간을 의미한다. 각 지역의 특정 시점의 처치 여부(d∈ {0, 1})에 따른 성과변수 는 연구의 관심 대상이 되는 변수로, 본 연구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를 의미한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의 효과는 다음의 (식 1)같이 나타낼 수 있다.
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역에서의 t시점의 성과변수를 의미하며 는 해당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관측되었을 잠재적 성과변수(potential outcome)를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 성과변수와 잠재적 성과변수 간의 차이로 계산되는 τ1t는 t>T0인 시점에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의 효과를 나타낸다.
통제집단 합성의 주요 목표는 처치시점 이후 정책개입이 없었을 경우 나타났을 잠재적 성과변수 를, 유사한 특성을 지닌 통제집단의 결합을 통해 추정하는 것이다. 해당 방식은 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비교 지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데이터를 가중 평균하는 방식을 통해 합성하여 처치집단과 유사한 통제집단을 생성한다는 특성이 있다. 합성을 통한 처치효과는 (식 2)와 같이 계산된다.
통제집단합성법은 처치 이전 예측변수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통제집단들의 가중치를 설정함으로써, 객관적인 비교집단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식 3)은 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해 최소화되는 거리함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X1 (k ×1)은 처치집단의 예측변수벡터, X0 (k×J)는 대조후보군의 예측변수 행렬이며, W (J×1)는 통제집단에 부여되는 합성가중 치 벡터를 나타낸다. 모든 가중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의 제약조건을 만족한다.
이러한 방식은 데이터 간 외삽(extrapolation)을 방지한다. Xkj는 지역별로 성과변수를 설명하는 예측변수로, 지역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포함한 k개의 변수로 구성된다. (식 3)의 vh는 h번째 예측변수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상수로,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지정하거나 최적화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 최적의 는 (식 4)와 같이 평균제곱예측오차(mean squared prediction error, MSPE)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도출된다. 이 때 V는 각 vh를 대각선 원소로 포함하는 k×k 대각행렬을 의미한다.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해 추정된 정책 효과의 유의성은 플라시보 검정(placebo test)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플라시보 검정은 처치집단이 아닌 임의의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합성통제집단법을 반복 적용하여 위약효과(placebo effects)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순열 분포(permutation distribution)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순열 분포는 정책 처치가 무작위로 할당되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효과의 분포를 기반으로 하며, 처치집단에 대한 추정 효과가 이 분포의 상위에 위치할 경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통제집단합성법 기반의 정책 효과는 처치 이전 기간의 예측 적합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플라시보 검정에서도 사전 적합도를 고려한 비교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검정통계량은 (식 5)와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는 j번째 집단을 처치집단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t시점에서 합성된 통제집단의 성과변수를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식 5)는 통제집단합성의 추정량에 대한 평균제곱근예측오차(root mean squared prediction error, RMSPE)를 나타낸다(0 ≤ t1 ≤ t2 ≤ T). 처치시점 이전 기간 동안 통제집단이 처치집단과 얼마나 잘 합성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처치 이후 기간과 이전 기간의 RMSPE를 비교하여, (식 6)과 같이 비율을 계산한다.
정책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경험적 p-값을 기반으로 추론하며, 이는 각 rj에 대한 순열분포에 따라 (식 7)과 같이 정의된다.
이때, I+ (•)는 rj-r1 ≥ 0일 경우 1, 그 외에는 0을 반환하는 지시함수이다. 본 연구에서 (식 7)을 이용하여 경험적 p-값을 계산하였다.
통제집단합성법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처치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이 복수의 지역을 처치지역으로 설정하는 경우 연구설계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cemoglu et al.(2016)은 각 처치지역에 대해 개별적으로 통제집단합성법을 적용한 반면, Kreif et al.(2016)은 복수의 처치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단일한 처치지역으로 통합한 후 분석을 수행하였다(하정원 외, 2022). 본 연구는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을 각각 독립적인 처치지역으로 설정하고, 각 지역별로 통제집단합성법을 개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 효과의 지역별 이질성을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지가 안정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처치지역과 대조후보군의 공간적 분포를 나타낸다. 처치지역은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시의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이다. 분석기간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4개년이며, 이 중 2010년부터 2019년까지를 처치 이전 기간, 2020년부터 2023년까지를 처치 이후 기간으로 구분하였다. 대조후보군은 강남3구 및 용산구에 속한 총 73개 법정동 중, 분석 기간(2010~202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적이 없는 44개 법정동으로 구성하였다.1) 이들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영향을 받지 않은 비처치지역으로,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해 처치지역과 비교 가능한 대조군을 합성하는 데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 정책 효과 분석에 활용된 성과변수는 표준지 공시지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공시하는 지가 자료로, 토지 가치의 변동을 가장 직접적이고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대표적 지표이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자산의 기초가격으로서 주택가격의 생산비용 및 자산가치 측면 모두에 영향을 미치며, 지역 간 이질적 가격 수준을 통제하는 데 유용하다(이명환 외, 2013). 본 연구는 각 법정동에 포함된 모든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평균하여 연도별 대표값을 산출하였다. 표준지 수나 구성은 연도별로 일부 변동할 수 있으나, 공시지가는 동일한 평가 체계하에서 산정되는 공공 목적의 지가 지표이며, 동 단위 평균값에 체계적 편향을 유발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였다.
합성통제지역을 구성하기 위한 예측변수로는 주택 재고, 가구 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대지면적, 인구 순이동 및 총이동을 포함하였다. 공급 측 예측변수로는 주택재고를 포함하였으며, 이는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전체 주거용 주택의 물량을 의미한다. 주택재고는 장기적인 균형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 활용되었다(Algieri, 2013; Malpezzi and Maclennan, 2001). 수요 측면에서는 가구 수를 포함하였다. 이는 주택이 일반적으로 가구 단위로 소비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주택수요의 대리변수로 설정하였다(Marinković et al., 2024). 사업체 수는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 수준과 공간적 집적도를 반영하는 지표로, 지역 경제의 활력과 토지가치 형성에 있어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한다(Kopczewska et al., 2021). 종사자 수는 지가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지표로 활용되며, 지역 내 노동시장 규모를 반영한다(Liu et al., 2016). 인구이동 관련 변수로는 순이동(전입-전출)과 총이동(전입+전출)을 포함하였다. 이는 단순한 인구 규모의 증감뿐만 아니라, 전입과 전출이라는 양측 경로가 인구 조정에 모두 영향을 미치며, 정책 시행 이전의 지가 수준에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Davis et al., 2013). 각 자료는 통계청 주택총조사의 총 주택 수, 서울특별시 기본통계의 일반 가구 수, 사업체 현황, 토지 현황, 인구이동통계를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성과변수인 공시지가의 과거 값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단위로 포함하였다. 이는 처치 이전 기간 전체의 공시지가를 예측변수로 포함하는 경우, 공변량이 가중치 추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성과변수의 적합도만 높이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며(김민규 외, 2024; 이희선 외, 2020; Kaul et al., 2015),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된 시점의 과거 값을 선택하였다. 이들 변수는 각각 2010년 또는 2015년 시점의 값, 혹은 2010~2019년 기간의 평균값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Ⅳ. 분석결과
합성통제지역은 각 처치지역별로 가중치가 양(+)의 값을 갖는 일부 지역들만을 선형결합하여 구성되었으며, 나머지 지역은 최적화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전체 대조후보군 중 일부 지역만이 합성에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며, 가중치는 해당 지역이 처치지역의 반사실적 경로를 구성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의미한다.2)
<표 2>는 처치지역과 합성통제지역 간 예측변수의 평균값을 비교하고, 변수별 가중치를 제시한 것이다. 대부분의 변수에서 두 집단 간 유사한 수준의 평균값이 확인되며, 이는 합성통제지역이 처치지역의 구조적 특성과 시계열 패턴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책 시행 이전 시점에서의 성과변수인 공시지가 차이를 바탕으로 산출된 RMSPE는 잠실동 0.321, 삼성동 0.731, 대치동 0.169, 청담동 0.176으로 나타났다. RMSPE는 합성통제지역이 실제 처치지역의 시계열을 얼마나 정밀하게 모사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정책 시행 이외의 외생적 요인이 처치지역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정책 효과를 식별할 수 있는 적절한 비교집단이 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김민규 외, 2024). 이와 같은 사전 적합도는 통제집단합성법의 추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며, 이후 관측되는 정책효과의 방향성과 크기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그림 2>는 통제집단합성법을 활용하여 추정한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의 공시지가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각 그래프에서 실선은 실제 처치지역의 공시지가, 점선은 합성통제지역의 추정 공시지가, 붉은색 세로선은 정책 시행 시점인 2020년을 의미한다. 2020년 이전에는 실제값과 합성값이 거의 일치하거나 매우 유사한 추세를 보이며, 이는 합성통제지역이 처치지역의 공시지가 추세를 사전 기간에 잘 재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통제집단합성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정량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지만(Bouttell et al., 2018), 시각적으로 사전 시계열이 충분히 근접한 경우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2020년 정책 시행 이후에는 지역별로 실제 지가와 합성 지가 간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양상이 관측된다. 이러한 차이를 토지거래허가제가 지가에 미친 정책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은 앞서 <그림 2>에서 시각적으로 제시된 결과를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토지거래허가제가 지가에 미친 영향을 연도별로 수치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각 수치는 해당 연도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실제 시행된 경우 지가가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를 의미하며, 공시지가 기준 백만 원/㎡ 단위로 나타낸다. 분석 결과,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지가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 효과를 보인 반면, 나머지 세 지역은 오히려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규제 정책이 지역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잠실동의 경우, 규제시행으로 인해 지가는 2020년에 약 99만 원, 2021년 186만 원, 2022년 257만 원, 2023년 253만 원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연평균 약 199만 원의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하락 폭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지속적으로 지가 상승 압력을 억제하며 정책 효과를 발휘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삼성동에서는 규제 시행 이후에도 지가가 꾸준히 상승하여 정책의 역효과가 나타났다. 지가는 2020년 186만 원, 2021년 254만 원, 2022년 335만 원, 2023년 323만 원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폭은 275만 원에 달한다. 규제 시행 이후에도 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점은, 해당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질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했거나, 개발 기대, 수요 집중 등 외생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치동 또한 지가 상승 효과가 관측되었지만, 그 정도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수준에 머물렀다. 지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각각 20만 원, 60만 원, 98만 원 및 67만 원 상승하였으며, 연평균 약 62만 원의 증가가 나타났다. 이는 규제 효과가 제한적으로 작동하였음을 의미한다. 청담동은 대치동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나, 상승폭은 더 뚜렷하다. 2020년 34만 원, 2021년 78만 원, 2022년 161만 원, 2023년 176만 원 증가하였고, 연평균 상승폭은 약 112만 원에 이른다. 특히 청담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가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고급 주거지로서의 상징성과 투자 자산으로서 고가 부동산에 대한 선호가 규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킨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 지역 | 2020 | 2021 | 2022 | 2023 | 평균비율 |
|---|---|---|---|---|---|
| 잠실동 | -0.9906 | -1.8604 | -2.5667 | -2.5278 | -0.1281 |
| 삼성동 | 1.8555 | 2.5431 | 3.3514 | 3.2333 | 0.1440 |
| 대치동 | 0.2015 | 0.6040 | 0.9832 | 0.6748 | 0.0439 |
| 청담동 | 0.3368 | 0.7770 | 1.6090 | 1.7604 | 0.0784 |
한편, 복수의 처치지역을 비교할 경우에는 절대적 효과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효과의 크기 또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앞서 (식 2)에서 도출된 연도별 평균 처치효과를 처치 이후 기간 동안의 합성통제지역 성과변수 평균 값으로 나누어 상대적 차이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도출된 값은 정책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정규화된 형태로 표현하는 지표로, 지역간 비교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데 유용하다(Dube and Zipperer, 2015; Lee, 2024).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식 8)을 활용하여 평균 비율 차이를 산출하였다.
평균 비율 계산 결과, 잠실동은 ‒0.1281로 음의 값이 나타났으며, 삼성동 0.1440, 청담동 0.0784, 대치동 0.0439 순으로 양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잠실동에서 정책 시행 이후 지가가 합성통제지역보다 더 낮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음을 의미하며, 절대적 수준뿐만 아니라 상대적 효과 측면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의 지가 안정화 효과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례로 평가된다. 반면, 삼성동은 연도별 처리효과뿐 아니라 상대적 비율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규제의 실효성이 제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가 상승을 가속화한 역효과 사례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해 도출한 지가 변화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플라시보 검정을 수행하였다. 플라시보 검정은 각 대조후보군을 하나씩 가상의 처치지역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합성통제지역을 구성하고, 그에 따른 처리효과를 계산한 후, 이를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의 실제 처치효과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에서 나타난 효과가 우연한 현상이 아닌, 정책 처치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조후보군은 합성통제지역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처치시점 이전부터 실제값과 합성값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이는 정책 시행 이전 시점에서의 성과변수 추세가 합성통제지역에서 적절히 재현되지 않은 경우로, 해당 지역의 처치효과는 정책효과라기보다 합성 실패에서 기인한 오차로 해석된다(Abadie et al.,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사전 MSPE가 실제 처치지역의 MSPE보다 5배 이상 큰 지역을 적합하지 않은 플라시보 지역(placebo unit)으로 판단하고, 검정에서 제외하였다(김민규 외, 2024; 이희선 외, 2020; 하정원 외, 2022; Lee, 2024). 플라시보 검정의 결과는 경험적 p-값을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된다. 경험적 p-값은 처치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추정된 처치효과가 실제 처치지역의 처치효과보다 크거나 같은 비율로 정의되며(Abadie et al., 2015), 해당 값이 작을수록 정책효과가 우연히 나타날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즉, p-값이 충분히 작다면, 관측된 처치효과는 우연이 아니라 정책 개입에 의해 발생한 유의미한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은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에 대해 수행된 플라시보 검정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각 그림에서 검정 실선은 해당 처치지역의 연도별 처치효과를 나타내며, 회색 선들은 각각의 대조후보군에 대해 가상의 처치를 부여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추정한 플라시보 처치효과를 의미한다. 검정 실선이 회색 선들보다 뚜렷하게 상방 또는 하방에 위치할 경우, 이는 해당 지역의 정책효과가 플라시보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크며, 통계적으로 유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4>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연도별로 추정된 처치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경험적 p-값을 나타낸다. 잠실동의 경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모든 연도에서 p-값이 0.1 이하로 나타났으며, 처리효과 또한 음(‒)의 값을 지속적으로 기록하였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잠실동에서는 모든 연도에 걸쳐 유의미한 정책 효과를 발휘하였음을 의미한다. 삼성동 역시 전 기간 동안 처리효과가 양(+)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모든 연도에서 p-값이 10% 유의수준을 만족하였다. 이는 삼성동에서는 규제가 의도한 정책 효과로 이어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책 시행 이후 지가가 유의하게 상승한 역효과가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대치동의 경우, 모든 연도에서 p-값이 0.1을 초과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치동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지가 억제 효과가 존재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영향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청담동의 경우, 2020년과 2021년에는 p-값이 각각 0.1707, 0.1463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0.0488 및 0.0244로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청담동에서는 초기에는 정책 효과가 없었으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가 상승이 유의하게 확대된 역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지역별로 상이한 효과를 유발하였으며, 그 정책 효과 또한 일관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통제집단합성법을 활용하여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가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의 지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효과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지가 안정화 효과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잠실동에서는 정책 시행 이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약 199만 원의 공시지가 하락이 관측되며, 정책이 의도했던 지가 억제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삼성동에서는 연평균 약 275만 원의 지가 상승이 발생하여, 정책의 역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대치동과 청담동에서는 규제의 실질적 영향이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규제 정책이라 하더라도 지역별로 상이한 지가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네 지역 모두 고가 주거지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한 자산 수준이 아니라 각 지역의 수요 구조, 개발 기대, 제도 수용성 등 다양한 맥락적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를 유발한 구체적인 요인을 실증적으로 식별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후속 연구에서 제도 효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내생적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향후 지역별 시장 특성에 따라 규제 강도와 적용 대상을 차별화하는 공간 맞춤형 지정 기준과 선별적 규제 설계 방식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분석에서 규제 대상을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의 ‘전체 토지’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2023년 11월에는 아파트 용도에 한정된 ‘핀셋형 지정’이 도입되었고, 2025년 2월에는 일부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파트가 규제에서 해제되면서 같은 동 내부에서도 지정 여부가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공시지가 자료의 필지별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용도별 차이를 반영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실거래가, 거래량 등의 시장 지표를 함께 활용한다면, 토지거래허가제가 시장에 미친 영향을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